저희 런던집은
부동산 개발회사가
보유한 여러 채 중 하나인 듯 했어요.
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것 같고
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.
영업 담당...
공과금 담당...
수리보수 담당...
(누가 하나하나 안내해 준 것이 아니라,
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.)

제게 '이 중 고르라' 했던,
(브렉시트와 코로나로)
세를 현격하게 낮추어 나온 집들을 보면
모두 작정하고
(나름 테마는 있지만)
예산의 한도 내에서
호텔처럼 있을 건 갖추느라 애 쓴
동일한 인테리어였거든요.

제 취향 아니지만
저희 짐 도착할 때까지
단기 투숙스럽게
장기 투숙할 수 있는 게
큰 메리트라 생각하고
호텔을 따로 잡지 않고
히드로 공항에서 바로 저희집으로 와서
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.

이때까지
(학교가 소개한 부동산하는 학부형)
케런 아줌마와
저랑 삼자로 집계약 했던
부동산 회사의 죠셉에게
환영한다는 이메일은 올 줄 알았어요...?
자가 격리 중
온 이메일은 되려
같은 회사의 다이애나란 사람의
거두절미 아래 연락이었습니다: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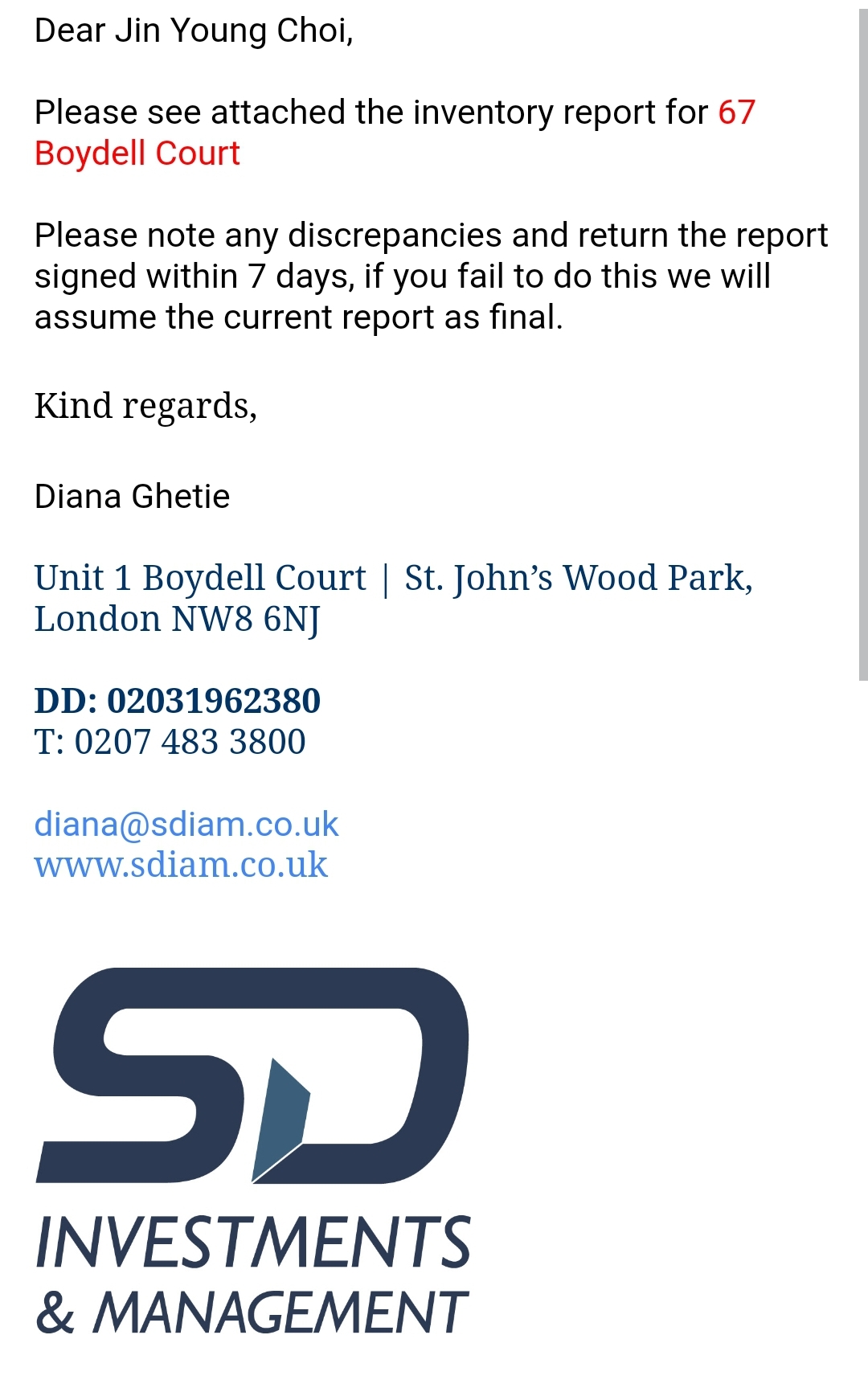
헬로우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.
런던 입성하여 받은
거의 첫 이메일이나 다름없었는데
저를 더 깊은 자가격리 우울로
밀어넣어 주셨습니다.
집 구하는 과정에서
케런 아줌마가
저의 브로드밴드 회사 문의하는 이메일에
이 분을 Loop in 해서
함자나 본 적 있었던지라
그래도 공과금 담당이구나 알았지
(당시 답신이 나는 수도전기세 담당이라
모름, 이었거든요)
아니면 더 뭥미 했을뻔요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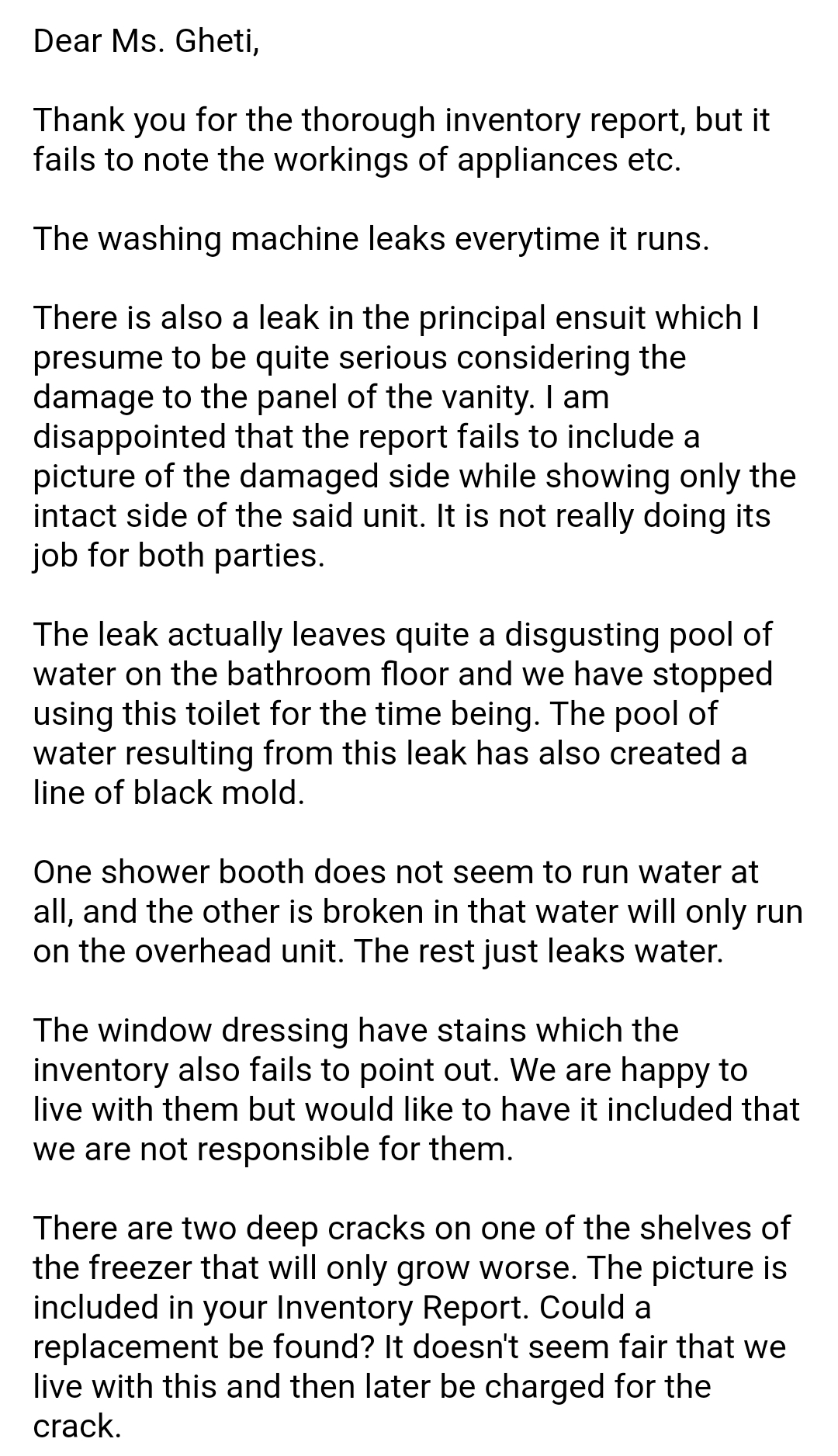
제3자에게 의뢰해서
작성되었다는 인벤토리 리포트의
편향성에 한번더 빈정 상하구요.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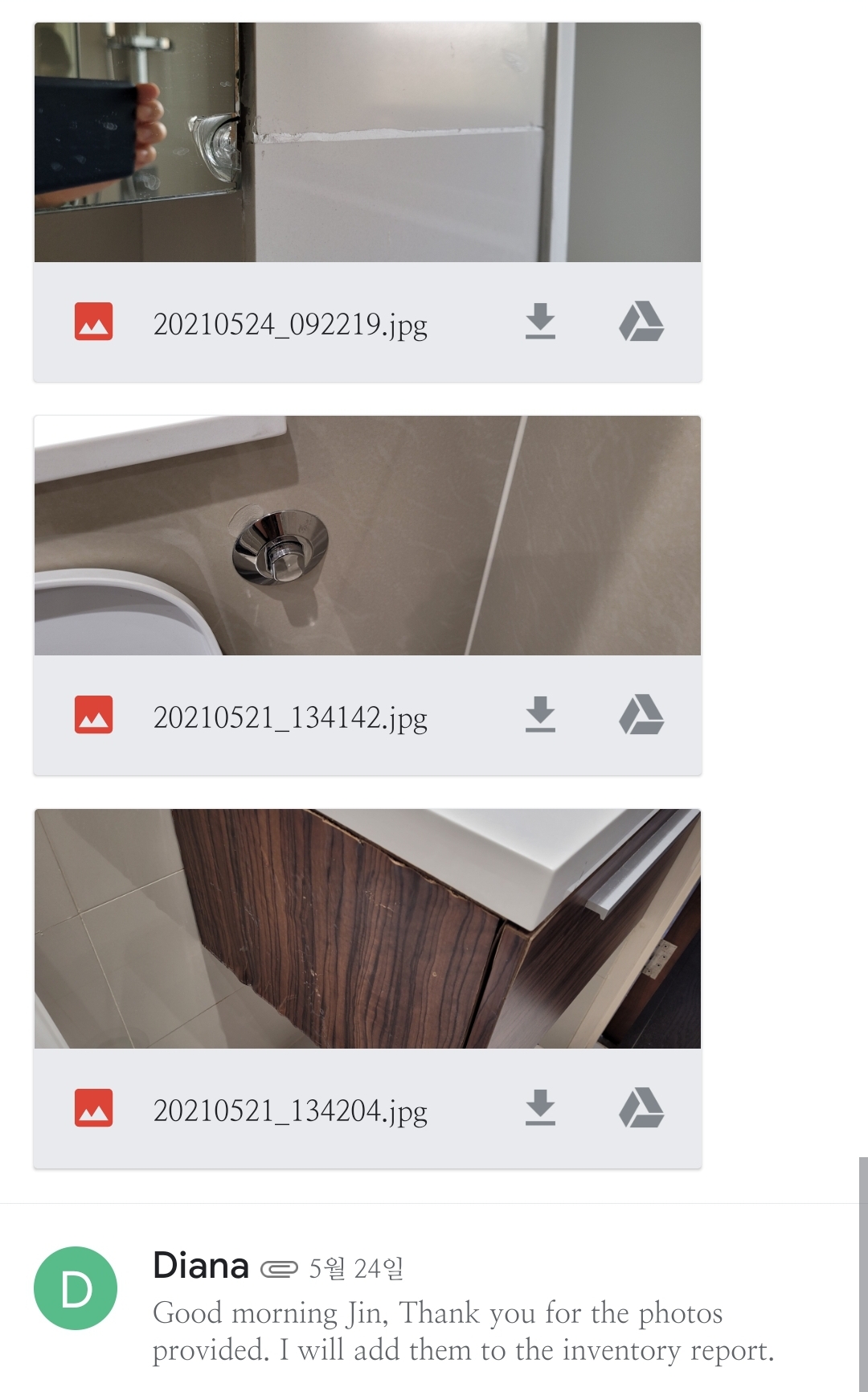
Handyman을 부르겠다고 하고
(이제 입국 4주차에 접어 들고 있지만
아직 해결된 건 없어요~)
냉동실 서랍은 새로 주문해 준다고
모델번호 받아 갔습니다.
제가 그냥 넘어가길 바란 것이라 생각하니...
모든 게 잘 정립되어 있다는
선진국 영국이 괘씸해지네요...

에휴...
어느것 하나
쉬운 게 없는 영국 생활의 시작이네요!